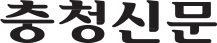애를 두 명 이상 낳거나 입양해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된 수급자가 1000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집계한 ‘출산 크레딧’의 혜택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 6월 현재 964명으로 집계됐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늘고 연금액수가 증가한 수급자는 누적으로 2011년 42명,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노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수 있게 하는 노후보장장치이다.
둘째 자녀는 가입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준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000원(2018년 기준) 오른다. ‘출산 크레딧’을 하는 그 배경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사실은 국가 경제차원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체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노년가구, 1인가구, 딩크족, 비혼족 등이 늘면서 학생 수가 급감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그 원인 및 부작용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기업 육아휴직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대상자 상당수가 이 제도에 긍정적이지 않아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 중심이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나의 행복’에 더 가치를 두고 있어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 것도 한 원인이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도심으로만 사람이 몰려 서울, 경기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의 집값은 하락하면서 빈부격차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장기 불황, 잃어버린 20년은 초고령사회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2026년이면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 비율이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년 동안 쓴 돈이 1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일자리, 주거비, 양육비 등 총체적인 사회적 문제가 맞물려져 단순한 출산 장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청년들에게 인식시키고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는 희망을 주는 인식전환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먼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본적인 근로문화는 물론이고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원활한 육아제도 시스템은 선결과제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총체적인 사회문제이다. 다시말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인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이를 해결키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점에서 출산크레딧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저출산의 심각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