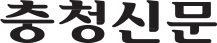мқҙ кіЎмқҖ мӢӨм ң мһҲм—ҲлҚҳ мӮ¬кұҙмқ„ л°”нғ•мңјлЎң л§Ңл“Өм–ҙмЎҢлӢӨ. к·ё мӢңм Ҳ лҢҖм „м—ӯм—җлҠ” лӘ©нҸ¬н–ү мҷ„н–үм—ҙм°Ёк°Җ м •л§җлЎң 0мӢң 50분м—җ мһҲм—ҲлӢӨкі н•ңлӢӨ. м–ҙлҠҗ 비 мҳӨлҠ” л°Ө, м—ӯл¬ҙмӣҗмқҙ мҠ№к°•мһҘм—җм„ң н•ң м—°мқёмқҳ мқҙлі„ мһҘл©ҙмқ„ лҙӨлӢӨ. лӮЁмһҗлҠ” кё°м°Ём—җ мҳ¬лқјнғҖкі , м—¬мһҗлҠ” 비лҘј л§һмңјл©° л– лӮҳк°ҖлҠ” м—ҙм°ЁлҘј н•ҳм—јм—Ҷмқҙ л°”лқјлҙӨлӢӨ. к·ё лӘЁмҠөмқ„ ліҙлҚҳ м—ӯл¬ҙмӣҗмқҙ к·ё м• м Ҳн•Ёмқ„ мһҠм§Җ лӘ»н•ҳкі к°ҖмӮ¬лЎң мҳ®кІјлӢӨ. к·ёк°Җ л°”лЎң мһ‘мӮ¬к°Җ мөңм№ҳмҲҳлӢҳмқҙл©°, нӣ—лӮ м•„м„ём•„л ҲмҪ”л“ң лҢҖн‘ңк°Җ лҗң мқёл¬јмқҙлӢӨ. к·ёлӮ мқҳ мғҲлІҪ, лҢҖм „м—ӯмқҖ н•ң лӮЁл…Җмқҳ мқҙлі„мқ„ н’Ҳмңјл©° н•ң мӢңлҢҖмқҳ лӘ…кіЎмқ„ лӮім•ҳлӢӨ.
лҢҖм „л¶ҖлҘҙмҠӨлҠ” лҢҖм „м—ӯмқ„ л°°кІҪмңјлЎң лӮЁл…Җ к°„ мқҙлі„мқҳ мҠ¬н””кіј м„ңлҹ¬мӣҖмқ„ л…ёлһҳн•ңлӢӨ. мӢңк°„мқҙ нқҳлҹ¬ нҷҳкІҪмқҖ ліҖн–Ҳм§Җл§Ң, кё°лӢӨлҰ¬кі ліҙлӮҙлҠ” мӮ¬лһҢмқҳ л§ҲмқҢл§ҢнҒјмқҖ ліҖн•ҳм§Җ м•Ҡм•ҳлӢӨ. мӢңлҢҖк°Җ лӢ¬лқјмЎҢм–ҙлҸ„ м—¬м „нһҲ лҢҖм „м—ӯмқҖ вҖҳл§ҢлӮЁкіј мқҙлі„мқҳ мғҒ징вҖҷмңјлЎң лӮЁм•„ мһҲлӢӨ.
м–ҙлҠҗмғҲ 2025л…„мқҳ 11мӣ”, лҳҗлӢӨмӢң лҢҖм „м—ӯмқҳ н’ҚкІҪмқҙ л– мҳӨлҘёлӢӨ. мӮҙлӢӨ ліҙл©ҙ л§ҢлӮЁкіј н—Өм–ҙм§җмқҙ л°ҳліөлҗҳлҠ” кІҢ мқёмғқмқҙлӢӨ. н•ҳм§Җл§Ң к·ё л°ҳліө мҶҚм—җм„ңлҸ„ мҡ°лҰ¬лҠ” м–ём к°Җ лҲ„кө¬м—җкІҢлӮҳ вҖҳл§Ҳм§Җл§ү м—ӯвҖҷмқҙ мһҲлӢӨлҠ” мӮ¬мӢӨмқ„ мһҠм§Җ м•ҠлҠ”лӢӨ.
к·ё л§Ҳм§Җл§үмқ„ м•ҲлӢӨл©ҙ мҳӨлҠҳ н•ҳлЈЁлҘј мҶҢмӨ‘нһҲ мӮҙм•„к°Ҳ мқҙмң к°Җ 분лӘ…н•ҙ진лӢӨ. мӮ¶мқҖ н•ң нҺёмқҳ мҳҒнҷ”мҷҖ к°ҷлӢӨ. лҲ„кө°к°ҖлҠ” кІҪм°°мІӯмһҘмңјлЎң, лҲ„кө°к°ҖлҠ” көҗмһҘмңјлЎң, лҲ„кө°к°ҖлҠ” кІҪлЎңлӢ№ нҡҢмһҘмңјлЎң мӮҙм•„к°„лӢӨ. лӘЁл‘җ к°Ғмһҗмқҳ л°°м—ӯмқ„ л§ЎмқҖ л°°мҡ°л“ӨмқҙлӢӨ. к·ёлҹ¬лӮҳ мҳҒнҷ”мҷҖ лӢӨлҘё м җмқҙ мһҲлӢӨл©ҙ мқёмғқм—җлҠ” лҰ¬н—Ҳм„Өмқҙ м—Ҷ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м—°мҠөлҸ„, лӢӨмӢң м°Қмқ„ кё°нҡҢлҸ„ м—ҶлӢӨ. мҳӨм§Ғ м§ҖкёҲ мқҙ мҲңк°„мқҙ м „л¶ҖлӢӨ.
лӮҳлҠ” лӘҮ л…„ лҸҷм•Ҳ 충лӮЁлҢҖлі‘мӣҗм—җм„ң нҳёмҠӨн”јмҠӨ лҙүмӮ¬лҘј н•ҳл©° мҲҳл§ҺмқҖ мӮ¬лһҢл“Өмқҳ л§Ҳм§Җл§үмқ„ м§ҖмјңлҙӨлӢӨ.
мҡ°лҰ¬лҠ” лӘЁл‘җ м•Ҳ мЈҪмқ„ кІғмІҳлҹј мӮҙм§Җл§Ң, м–ём к°ҖлҠ” лӮҙ лӘёмқ„ лӮҙ л§ҲмқҢлҢҖлЎң м ңм–ҙн• мҲҳ м—Ҷмқ„ л§ҢнҒј л¬ҙмһҘ н•ҙм ңлҗҳлҠ” лӮ мқҙ мҳЁлӢӨ. л§Ҳм§Җл§үмқ„ м•һл‘” мқҙл“ӨмқҖ н•ҳлӮҳк°ҷмқҙ л§җн–ҲлӢӨ. вҖңлӘ©мҡ• н•ң лІҲ л§ҲмқҢк»Ҹ н•ҙ ліҙкі мӢ¶м–ҙмҡ”.вҖқ вҖңмЎ°кёҲл§Ң лҚ” кұёмқ„ мҲҳ мһҲлӢӨл©ҙ мўӢкІ м–ҙмҡ”.вҖқ вҖңмқҙм ңм•ј мһ‘мқҖ кІғл“Өмқҳ мҶҢмӨ‘н•Ёмқ„ м•ҢкІ м–ҙмҡ”.вҖқ мӣҖм§Ғмқј мҲҳ м—Ҷм–ҙ лҙүмӮ¬мһҗмқҳ мҶҗм—җ лӘёмқ„ л§Ўкё°л©ҙм„ңлҸ„, к·ёл“ӨмқҖ вҖңк°җмӮ¬н•©лӢҲлӢӨвҖқлқјлҠ” л§җмқ„ мһҠм§Җ м•Ҡм•ҳлӢӨ. к·ёлҰ¬кі вҖңм—¬н–үмқ„ л§Һмқҙ лӘ» лӢӨлӢҢ кІҢ м•„мү¬мӣҢмҡ”.вҖқ вҖңлӮЁкіј 비көҗн•ҳлҠҗлқј лӮҙ мӮ¶мқ„ мһғм—Ҳм–ҙмҡ”.вҖқ вҖңк°җмӮ¬н•ҙм•ј н• мқјл“Өмқҙ л„Ҳл¬ҙ л§Һм•ҳлҠ”лҚ°, н‘ңнҳ„н•ҳм§Җ лӘ»н•ң кІғмқҙ нӣ„нҡҢмҠӨлҹ¬мӣҢмҡ”.вҖқ к·ёл“Өмқҳ л§җмқҖ лӮЁмқҖ мһҗл“Өм—җкІҢ м „н•ҳлҠ” мЎ°мҡ©н•ң л©”мӢңм§ҖлӢӨ.
мҡ°лҰ¬лҠ” мҠӨмҠӨлЎңмқҳ мӮ¶мқ„ м„ нғқн•ҙм•ј н•ңлӢӨ. м§ҖлӮҳмҳЁ мӢңк°„мқ„ нӣ„нҡҢн•ҳм§Җ л§җкі , мҳӨлҠҳл¶Җн„° мғҲлЎңмҡҙ лӮҳлЎң мӮҙм•„к°Җм•ј н•ңлӢӨ. к·ёкІғмқҙ мқёмғқмқҳ м§„м •н•ң мҡ©кё°лӢӨ.
лІҢмҚЁ 2025л…„лҸ„ м Җл¬јм–ҙ к°„лӢӨ. лҢҖм „л°ң 0мӢң 50분, лӘ©нҸ¬н–ү мҷ„н–үм—ҙм°ЁмІҳлҹј мқёмғқмқҳ мӢңк°„лҸ„ мүј м—Ҷмқҙ нқҳлҹ¬к°„лӢӨ. мЎ°мҡ©нһҲ л– лӮҳк°ҖлҠ” к·ё мӢңк°„ мҶҚм—җм„ң лӮҳлҠ” лӮҙкІҢ 묻лҠ”лӢӨ. вҖңлӮҳлҠ” мҳӨлҠҳмқ„ м–јл§ҲлӮҳ 진мӢ¬мңјлЎң мӮҙм•ҳлҠ”к°Җ?вҖқ к°•мқҳ мӨ‘ мҲҳк°•мғқл“Өм—җкІҢ лҠҳ мқҙл ҮкІҢ л§җн•ңлӢӨ. вҖңм ңк°Җ л§җм”Җл“ңлҰҙ л•Ң м—¬лҹ¬л¶„мқҖ нҒ¬кІҢ вҖҳлӢ№м—°н•ҳм§Җ!вҖҷлқјкі лӢөн•ҙмЈјм„ёмҡ”. 1.лӮҳлҠ” мқёмғқмқҙ н•ң лІҲлҝҗмқҙлқјлҠ” кұё м•Ңкі мһҲлӢӨ. 2.лӮҙ мӮ¶м—җлҸ„ 비к°Җ мҳӨкі , л°”лһҢмқҙ л¶Ҳкі , лҲҲмқҙ мҳЁлӢӨлҠ” кұё м•Ңкі мһҲлӢӨ. 3.лӮҙ мқёмғқмқҳ мўӢмқҖ лӮ мқҖ м•„м§Ғ мҳӨм§Җ м•Ҡм•ҳлӢӨ. 4.лӮҙ кҝҲкіј лӮҙ мғқк°Ғ, лӮҙ л§җлҢҖлЎң лҗ кІғмқҙлӢӨ. 5.м—¬кё°к№Ңм§Җ лІ„н…ЁмҳЁ лӮҳ мһҗмӢ мқҙ мһҗлһ‘мҠӨлҹҪлӢӨ. 6.к°җмӮ¬н• кІғмқҙ м—Ҷм–ҙлҸ„ к°җмӮ¬н• кұ°лҰ¬лҘј м°ҫкІ лӢӨ.вҖқ к·ёл ҮкІҢ м„ңлЎң мҷём№ҳлӢӨ ліҙл©ҙ м–ҙлҠҗмғҲ л§ҲмқҢмқҙ л”°лң»н•ҙм§Җкі , мӮ¶мқҙ мЎ°кёҲмқҖ к°ҖлІјмӣҢ진лӢӨ. к·ёкІғмқҖ мҲҳк°•мғқлҝҗ м•„лӢҲлқј л°”лЎң лӮҳ мһҗмӢ м—җкІҢ кұ°лҠ” л§ҲлІ•мқҙлӢӨ.
лҜёкөӯмқҳ мһ‘к°Җ лІ„лӢҲ мӢңкІ”мқҖ л§җн–ҲлӢӨ. вҖңн•ҳлӮҳлӢҳмқҳ мұ…мғҒ мң„м—җлҠ” мқҙлҹ° л¬ёкө¬к°Җ м ҒнҳҖ мһҲлӢӨ. л„Өк°Җ л¶Ҳн–үмқ„ л§җн•ҳкі лӢӨлӢҢлӢӨл©ҙ л¶Ҳн–үмқҙ м–ҙл–Ө кІғмқём§Җ ліҙм—¬мЈјкІ лӢӨ. н•ҳм§Җл§Ң л„Өк°Җ н–үліөмқ„ л§җн•ҳкі лӢӨлӢҢлӢӨл©ҙ н–үліөмқҙ м–ҙл–Ө кІғмқём§Җ ліҙм—¬мЈјкІ лӢӨ.вҖқ кІ°көӯ н–үліөлҸ„, л¶Ҳн–үлҸ„ м„ нғқмқҳ л¬ём ңлӢӨ. л§җ н•ңл§Ҳл””, мғқк°Ғ н•ҳлӮҳк°Җ лӮҙ мӮ¶мқҳ л°©н–Ҙмқ„ л°”кҫјлӢӨ. м–ҙл ӨмҡёмҲҳлЎқ н–үліөмқ„ м„ нғқн• мҲҳ мһҲлҠ” м§Җнҳңк°Җ н•„мҡ”н•ҳлӢӨ.
лҢҖм „л¶ҖлҘҙмҠӨлҠ” вҖңмһҳ мһҲкұ°лқј, лӮҳлҠ” к°„лӢӨвҖқлЎң мӢңмһ‘н•ҳм§Җл§Ң, лӮҳлҠ” мқҙл ҮкІҢ кі міҗ л¶ҖлҘҙкі мӢ¶лӢӨ. вҖңмһҳ мһҲкұ°лқј, н•Ёк»ҳ к°Җмһҗ.вҖқ мқҙлі„мқҳ л…ёлһҳмҳҖлҚҳ лҢҖм „л°ң 0мӢң 50분мқҙ мқҙм ңлҠ” н•Ёк»ҳ кұ·лҠ” мӮ¶мқҳ л…ёлһҳлЎң лӢӨмӢң мҡёл Ө нҚјм§Җкёё л°”лқјл©° лӢӨмӢң н•ңлІҲ нқҘм–јкұ°лҰ°лӢӨ. вҖңмһҳ мһҲкұ°лқј, лӮҳлҠ” к°„лӢӨвҖҰвҖқ м•„лӢҲ вҖңмһҳ мһҲкұ°лқј, н•Ёк»ҳ к°Җмһҗ.вҖ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