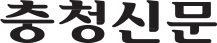[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지난달 충청권을 덮친 수해로 다방면 뒷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다음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물길 전체를 아우르는 대응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현행 체계와 이상기후에 대비 못 할 기준으로는 다시 찾아올 수마를 막을 수 없단 목소리다.
지난달 8일 용담댐은 초당 최대 2921t의 물을 방류했다. 이날 방류량은 매뉴얼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기준(계획방류량)은 3211t이다. 하지만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등 범람이 잇따르면서 금산·영동·옥천·무주 주택 171채와 농경지 754㏊가 물에 잠기고 414가구 6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역 내 한 전문가는 "큰 홍수가 발생하면 대상 유역의 모든 댐과 하천이 연계돼 각각의 최대 능력인 계획홍수량까지 방어해야 하지만 댐들을 최적 연계 운영할 수 없거나, 하천에 제방이 없거나, 노후돼 무너지거나, 높이가 부족해 월류하면 하류 하천은 당연히 큰 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실질적인 물관리 일원화 없이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홍수 대응 컨트롤타워가 없다. 물길은 이어져 있는데 관리 체계는 끊겨있던 셈이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관리는 환경부, 발전용댐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용수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한다. 국가·지방하천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맡고 있다. 신속하고 합리·효율적인 대응이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하다. 적어도 이번 같은 비상상황 시 협업체계라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매뉴얼과 시설 재정비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홍수기 제한수위와 방류체계 등 관리기준과 설계빈도 강화가 요구된다. 이상기후로 이번 같은 집중호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현재 댐은 2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폭우에 버티도록 설계됐고 국가하천은 100~200년, 지방하천은 30~80년 빈도가 적용돼 있다. 올해 폭우는 500년 빈도를 기록했다. 전문가는 "현재의 법령과 규정을 기후변화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면서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만큼 점진적으로라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이수·치수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탄력적 물관리도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