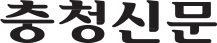м ҒкёҲмқ„ нғҖл©ҙ к°ҖмһҘ лЁјм Җ лӯҳ н• к№Ң? мӢңмһ‘н• л•җ лӘҮ лІҲ мғқк°ҒлҸ„ н–ҲлҚҳ кІғ к°ҷлӢӨ. лӮЁнҺёмқҳ м°Ёк°Җ мҳӨлһҳлҗҳкі лӮЎм•ҳмңјлӢҲ м„ мӢ¬ м“°л“Ҝ лҸҲ лҙүнҲ¬лҘј лҚҳм ёмЈјл©° м–ҙк№ЁлҘј мңјм“ұн•ҙ ліјк№Ң? н•ң мӮ¬лһҢ л“Өм–ҙм„ңл©ҙ л”ұ л§һлҠ” мһ‘мқҖ мӣҗлЈём—җм„ң мғқнҷңн•ҳлҠ” м•„л“Ө л…Җм„қмқҳ л°© нҸүмҲҳлҘј лҠҳл Өліјк№Ң? мқҙлҹ°м Җлҹ° мғқк°ҒмңјлЎң мҰҗкұ°мҡҙ н•ңлӮҳм Ҳмқ„ ліҙлӮҙлӢӨ л¬ёл“қ м§ҖлӮңлӮ м Җ축м—җ кҙҖн•ң мқҙм•јкё° н•ҳлӮҳк°Җ л– мҳ¬лһҗлӢӨ.
мҳӨлһҳм „ м№ңм •м—„л§Ҳк°Җ м№ мҲңм—җ л§ү м ‘м–ҙл“Ө л•ҢмҳҖлӢӨ. лӮ мқҙ м җм җ м—¬лҰ„мңјлЎң м№ҳлӢ«лҚҳ м–ҙлҠҗ лӮ 집 л’·л°ӯм—җ л“Өк№Ё лӘЁмў…мқ„ мӢ¬мңјлҹ¬ к°”лҚҳ м—„л§Ҳк°Җ м“°лҹ¬м§„ мқјмқҙ мһҲм—ҲлӢӨ. м—ҙмӮ¬лі‘мқҙм—ҲлӢӨ. н•Ёк»ҳ мқјн•ҳлҚҳ м•„лІ„м§Җк°Җ лҶҖлқј м–ҙм°Ңн• л°”лҘј лӘЁлҘҙкі мһҲлҠ”лҚ°, л§Ҳм№Ё мҳҶ집м—җ мӮ¬лҠ” м•„м Җм”Ёк°Җ мқҙ кҙ‘кІҪмқ„ ліҙкіӨ лӢ¬л Өмҷ”кі , мһ мӢң л§қм„Өмһ„лҸ„ м—Ҷмқҙ м°Ём—җ нғңмӣҢ лі‘мӣҗмңјлЎң лӮҙлӢ¬л ёлӢЁлӢӨ. к·ё лҚ•м—җ м—„л§ҲлҠ” к·ён•ҙ к°Җмқ„ к№»лӢЁмқ„ мҲҳнҷ•н–Ҳкі м§ҖкёҲк»Ҹ мӮҙм•„кі„мӢӨ мҲҳ мһҲм—ҲлӢӨ.
мҡ°лҰ¬ мһҗмӢқл“ӨмқҖ мҳҶ집 м•„м Җм”ЁлҘј л‘җкі л‘җкі к°җмӮ¬н•ҙн–ҲлӢӨ. 그분мқҳ л°ң л№ лҘё кё°лҸҷл Ҙмқҙ м—Ҷм—ҲлӢӨл©ҙ мөңм•…мқҳ кІҪмҡ°лҘј л§һмқҙн• мҲҳлҸ„ мһҲм—Ҳмқ„ мғҒнҷ© м•„лӢҲм—ҲлҚҳк°Җ. лӮҳмӨ‘м—җ м•Ҳ мқјмқҙм§Җл§Ң л°ӯмқјн•ҳлӢӨ м“°лҹ¬м§„ н„°лқј мҶҗмқҙкі л°ңмқҙкі мҳЁнҶө нқҷнҲ¬м„ұмқҙмҳҖлҚҳ м—„л§ҲлҠ” нҳјм Ҳн•ҳл©ҙм„ң нҶ н•ҳкё°к№Ңм§Җ н•ҙ м°Ё м•Ҳмқҙ м—үл§қ진м°Ҫмқҙм—ҲлӢӨкі н•ңлӢӨ. к·ёлҹјм—җлҸ„ н•ңл§Ҳл”” л¶ҲнҺён•ң лӮҙмғүмЎ°м°Ё н•ҳм§Җ м•Ҡм•ҳлҠ”лҚ° 그분мқҳ м§ҖлЎ м—җ мқҳн•ҳл©ҙ м—„л§Ҳк°Җ мў…мў… мһҗмӢ м—җкІҢ м Җ축мқ„ л§Һмқҙ н•ҙ лҶ“м•ҳкё° л•Ңл¬ёмқҙлқјкі н–ҲлӢӨ.
м„ңмҡём—җм„ң мқҳлҘҳ мӮ¬м—…мқ„ н•ҳлӢӨ л¶ҖлҸ„лҘј л§һкі лҸ„н”јн•ҳл“Ҝ мқҙкіі мӢңкіЁ, мҡ°лҰ¬ мҳҶ집мңјлЎң мқҙмӮ¬ мҷ”мқ„ л•Ң к·ёлҠ” н•ңм—ҶлҠ” л§үл§үн•Ём—җ м—җл‘ҳлҹ¬ м§ҖлғҲлӢӨкі н–ҲлӢӨ. к°ҖмЎұл“ӨкіјлҸ„ л–Ём–ҙм ё нҳјмһҗ кҫёлҰ° мӮҙлҰјмқҙ мҳӨмЈҪ м–ҙм„ӨнҺҗмқ„к№Ң. к·ёл•Ң м—„л§ҲлҠ” лҠҳ мӢқкө¬мІҳлҹј мҳҶ집мқ„ мұҷкё°кіӨ н–ҲлӢӨ. мқҢмӢқмқ„ лӮҳлҲ„кі м •мқ„ лӮҳлҲ„л©ҙ мӢқкө¬к°Җ лҗңлӢӨкі н•ҳм§Җ м•ҠлҚҳк°Җ. лңЁлҒҲн•ң л°Ҙ н•ң к·ёлҰҮ, к№Җм№ҳ лӘҮ нҸ¬кё°, м°Ңк°ңлҘј лҒ“м—¬лҸ„ лӢҙмһҘ л„ҲлЁёлЎң н•ң лғ„비씩 м „н•ҙмЈјкіӨ н–ҲлӢӨ. л§ҲлӢ№м—җ л¶ҲнҢҗмқ„ мҳ¬л Ө мӮјкІ№мӮҙмқ„ көҪлҠ” лӮ мқҙл©ҙ кё°кәјмқҙ л¶Ҳлҹ¬ н•Ёк»ҳ м Җл…Ғмқ„ лЁ№кіӨ н–ҲлҚҳ мӢңк°„мқҙ м•„м Җм”Ём—җкІҢлҠ” кі л§ҲмӣҖмқҳ мӮ°л¬јлЎң м Җ축мқҙ лҗҳм—ҲлӢЁлӢӨ. к·ёлҸҷм•Ҳ м—„л§Ҳм—җкІҢ м–»м–ҙлЁ№мқҖ л°Ҙк°’мқ„ мқҙм ңм•ј лҸҢл ӨмЈјм—ҲлӢӨл©° кІёмҶҗн•ҙн•ҳм…ЁлӢӨ. м•„м Җм”Ём—җкІҢ л“ӨмқҖ м Җ축мқҙлқјлҠ” лӢЁм–ҙк°Җ нҠ№лі„н–ҲлӢӨ.
нҳјмһҗ мӮ¬лҠ” м„ёмғҒмқҙ м•„лӢҢ мқҙмғҒ мқјмғҒмқ„ лҲ„лҰ¬л©ҙм„ң мЈјкі л°ӣмқҖ лҸ„мӣҖмқҙ лҲ„кө¬м—җкІҢл“ мһҲмқ„ кІғмқҙлӢӨ. лҲ„кө°к°Җм—җкІҢлҠ” к·ём Җ мһ к№җмқҳ кі л§ҲмӣҖмңјлЎң мҠӨміҗ м§ҖлӮ¬мқ„ мҲҳлҸ„, лҳҗ лӢӨлҘё мқҙм—җкІҢлҠ” м Җ축мңјлЎң л°”лҖҢкІҢ н•ҳлҠ” мһҘм№ҳк°Җ лҗҳлҠ” кІғмқҙкё°лҸ„ н•ҳлӢӨ.
л©°м№ м „ мқјн•ҳлҠ” мң м№ҳмӣҗм—җм„ң м•„мқҙк°Җ лӢӨміӨлӢӨ. лӢӨм„Ҝ мӮҙ лӮң л…Җм„қмқҙ мһҘлӮңм№ҳл©° лӣ°лӢӨк°Җ л„ҳм–ҙ진 кІғмқҙлӢӨ. мһ…мҲ мқҙ 붕м–ҙ мһ…мІҳлҹј нүҒнүҒ л¶Җм—ҲлӢӨ. ліҙкұҙмӢӨм—җ м—°лқҪн•ҙ м№ҳлЈҢн•ҳкі лӮҳлӢҲ мұ…мһ„мқ„ лӢӨн•ҳм§Җ лӘ»н–ҲлӢӨлҠ” мһҗмұ…мқҙ к·№лҸ„мқҳ м •мӢ м Ғ м••л°•к°җмңјлЎң лӘ°л Өмҷ”лӢӨ. к·ёлҹ¬лӮҳ м•„мқҙ м—„л§ҲлҠ” к°ңкө¬мҹҒмқҙ м•„л“Ө л•Ңл¬ём—җ л§Һмқҙ лҶҖлқјкІҢ н•ҙм„ң мЈ„мҶЎн•ҳлӢӨлҠ” л§җмқ„ лҚ§л¶ҷмқҙл©° мҳӨнһҲл Ө лӮҳлҘј кұұм •н•ҳлҠ” кІғмқҙ м•„лӢҢк°Җ.
к·ё м•„мқҙлҠ” н•ҳлЈЁ мӨ‘ к°ҖмһҘ лЁјм Җ мң м№ҳмӣҗ л¬ёмқ„ л‘җл“ңлҰ¬кі к°ҖмһҘ лӮҳмӨ‘к№Ңм§Җ көҗмӢӨм—җ лӮЁм•„ м—„л§ҲлҘј кё°лӢӨл ёлӢӨ. лӮҳлҠ” лҠҳ к·ё м•„мқҙк°Җ м•Ҳм“°лҹ¬мӣҢ мһҗмЈј к·јл¬ҙ мӢңк°„мқ„ л„ҳм–ҙм„ңк№Ңм§Җ к°ҷмқҙ мһҲм–ҙ мЈјкіӨ н–ҲлӢӨ. мӢңмһ‘мқҖ м„ н–үмқҙм—ҲмңјлӮҳ кІ°көӯ м§ҖлӮҳкі ліҙлӢҲ лӮҙ л§ҲмқҢмқҳ м Җ축мқҙ м•„мқҙ м—„л§Ҳм—җкІҢ к°Җ лӢҝм§Җ м•Ҡм•ҳлӮҳ мӢ¶лӢӨ.
мқјмғҒм—җм„ң мҳӨлҠҳлҸ„ мһҗмһҳн•ҳкІҢ м„ н–үмқ„ м Җ축н•ңлӢӨ. лҸ„мӣҖмқҙ н•„мҡ”н•ң лҲ„кө°к°Җм—җкІҢ лӮҳмқҳ мӢңк°„мқ„ нҲ¬мһҗн•ҙ м„ лң» лӮҳм„°мқ„ л•Ң нқ¬мғқн–ҲлӢӨкі мғқк°Ғн•ҳкё°ліҙлӢӨ нӣЁм”¬ лҚ” нҒ° л§ҢмЎұмһ„мқ„ м•Ңкё° л•Ңл¬ёмқҙлӢӨ. к·ёлҰ¬кі лҲ„кө°к°Җм—җкІҢ м „н•ҙ л°ӣмқҖ к·ё м„ н–үмқҖ л°ҳл“ңмӢң лӢӨлҘё мӮ¬лһҢм—җкІҢлҸ„ мҳ®кІЁм§„лӢӨлҠ” кІғмқ„ лҜҝкё° л•Ңл¬ёмқҙ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