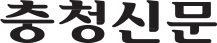AI의 확산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더 많이, 더 빨리”가 아니라 “무엇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 어떤 일에 시간을 써야 하는가”가 생산성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메일과 메신저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소통이 쉬워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쉬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졌고 실제로는 소통의 양이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AI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술이 편리해질수록 업무는 더 복잡해지고, 선택해야 할 정보는 늘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은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결국 답은 명확하다. 반복적 업무는 AI에 위임하고, 인간은 판단·협업·소통이라는 본질적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조직의 방향을 정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석하며, 사람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는 일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AI를 활용하자”는 기술적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재구성이다.
우리나라 조직의 많은 업무가 아직도 내용보다는 형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보고서 형식 맞추기, 수치 재검증, 형식적 회의 등은 AI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인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감정과 사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반면 AI는 24시간 착오 및 실수 없이 동일한 수준의 정확도로 반복 작업을 수행한다. 기계가 잘하는 일에 인간의 시간을 쓰는 것은 조직이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손실이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첫째,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를 과감하게 떼어내 AI에 맡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필수 과제로, 하드웨어적 변화와 소프트웨어적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확보된 시간을 사람 간 협업과 의사결정에 재배치해야 한다. 부서 간 조율, 갈등 조정, 장기 전략 수립 등은 조직 성과를 좌우하지만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밀려온 업무 영역이다. 셋째, 개인 역시 자기 성찰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가, 아니면 AI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새로운 시간관리의 기준이 될 것이다.
AI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배분 방식이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은 AI에게 넘기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문제 해결과 관계의 영역에 집중할 때 비로소 AI 시대의 진정한 생산성이 완성될 것이다. 기술혁신의 마지막 종착점이라 불리는 AI 시대, 이제는 “인간의 시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