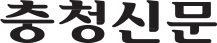мІ мӯүмқҙ лІҢмҚЁ лҒқл¬јм—җ м ‘м–ҙл“ лӢӨ. мӢұк·ёлҹ¬мҡҙ кі„м Ҳ кіЁм§ңкё° лҠҘм„ мқ„ нҷ”л Өн•ҳкІҢ л¬јл“Өмқё кҪғм—¬мҡёмқҙ лҙ„мқ„ л§Ҳл¬ҙлҰ¬н•ҳкі м—¬лҰ„мқҳ мӢңмһ‘мқ„ м•ҢлҰ¬кі мһҲлӢӨ. лЁ№кұ°лҰ¬к°Җ к·Җн–ҲлҚҳ мӢңм Ҳ, нҷ”м „мңјлЎң лЁ№мқҖ 진лӢ¬лһҳмҷҖлҠ” лӢ¬лҰ¬ лҸ… л•Ңл¬ём—җ лЁ№м§Җ лӘ»н•ҳлҠ” кұҙ л„җлҰ¬ нҡҢмһҗлҗң мӮ¬мӢӨмқҙлӢӨ. к·ё мҷё мІ мӯүмқҳ н•ңмһҗ мқҙлҰ„мқё мІҷмҙү ?? мҰү кҪғмқҙ л„Ҳл¬ҙ м•„лҰ„лӢӨмӣҢ кұёмқҢмқ„ л©Ҳ추кІҢ лҗңлӢӨлҠ” кІғлҸ„ лҲ„м°Ё л“Өм–ҙмҷ”мңјлӮҳ 진лӢ¬лһҳ лӢӨмқҢм—җ н”јм–ҙм„ң м—°лӢ¬лһҳлқјкі л¶ҖлҘёлӢӨлҠ” кұҙ мғқмҶҢн•ҳлӢӨ.
н•ҳкё°м•ј 진лӢ¬лһҳлҸ„ 분нҷҚмғүмқҙл©ҙ м—°лӢ¬лһҳлқјкі н–ҲлӢӨ. м•Ңл§һкІҢ л¶үмңјл©ҙ 진лӢ¬лһҳ, мһҗмЈјмғүмқҙл©ҙ лӮңмҙҲ л№ӣ к°ҷлӢӨ н•ҳм—¬ лӮңлӢ¬лһҳлқј н–ҲлӢӨ. к°Җлң©мқҙлӮҳ 비мҠ·н•ң н„°м—җ мқҙлҰ„к№Ңм§Җ кІ№м№ң м…Ҳмқҙлҗҳ 진лӢ¬лһҳлҘј м—°лӢ¬лһҳлқјкі н• л•Ңмқҳ м—°и»ҹмқҖ л№ӣк№”мқҙ м—°н•ҳлӢӨлҠ” лң»мқҙкі мІ мӯүмқҳ м—°пҰҡлӢ¬лһҳлҠ” л’ӨлҜёмІҳ н•ҖлӢӨлҠ” лң»мңјлЎң м—„л°ҖнһҲ лӢӨлҘёлҚ°лҸ„ мһҗмЈј н—·к°ҲлҰ°лӢӨ.
진лӢ¬лһҳмҷҖ мІ мӯүмқҖ к·ёл ҮкІҢ м„ңлЎң м—Ү비мҠ·н•ҳлӢӨ. мғқк№ҖмқҖ л¬јлЎ л№ӣк№”лҸ„ нқЎмӮ¬н•ҳм§Җл§Ң мӢңкё°м ҒмңјлЎң 진лӢ¬лһҳк°Җ лЁјм Җ н”јкі мІ мӯүмқҖ лӮҳмӨ‘мқҙлӢӨ. кҪғмһҺлҸ„ 진лӢ¬лһҳлҠ” кҪғмқҙ л–Ём–ҙ진 лӢӨмқҢм—җ мһҺмқҙ лҸӢм•„лӮҳкі мІ мӯүмқҖ кҪғмқҙ н”јл©ҙм„ң лҸӢлҠ”лӢӨ. к·ё мҷём—җ 진лӢ¬лһҳмқҳ кҪғмһҺмқҖ м–Үкі нҲ¬лӘ…н•ҙм„ң мҶҢл…Җ к°ҷмқҖ мқҙлҜём§ҖмҳҖмңјлӮҳ мІ мӯүмқҖ л‘җк»Қкі л№ӣк№”мқҙ 진н•ң кІҢ мңЎк°җм ҒмқҙлӢӨ. кҪғмһҺ м—ӯмӢң л§Ңм ё ліҙл©ҙ лҒҲм ҒлҒҲм Ғн•ң кІҢ нҲ¬лӘ…н•ң 진лӢ¬лһҳмҷҖлҠ” л”ҙнҢҗмқҙлӢӨ. к·ёлһҳм„ң лӮҳмҳЁ лі„лӘ…мқҙ 진лӢ¬лһҳлҠ” м°ёкҪғмқҙкі мІ мӯүмқҖ лҸ…м„ұмқҙ мһҲлҠ” кёҲкё°мқҳ кҪғмңјлЎң м•Ңл ӨмЎҢлӢӨ. к·ёл§Ңм№ҳ мҳӣлӮ л¶Җн„° л…јлһҖмқҙ 분분н–ҲлҚҳ кІғмқјк№Ң.
мӢ лқј мӢңлҢҖмқҳ н—Ңнҷ”к°Җм—җ л“ұмһҘн•ҳлҠ” кҪғмқҙ 진лӢ¬лһҳмқём§Җ мІ мӯүмқём§Җ м• л§Өн•ҳлӢӨлҠ” кІғлҸ„ к·ё л•Ңл¬ёмқҙкІ м§Җл§Ң 진лӢ¬лһҳк°Җ м••к¶Ңмқё кІғмқҖ 진лӢ¬лһҳлҠ” м„ұ분мқҙ мҲңн•ҙм„ңмқём§Җ н•ҖмңјлЎң кҪӮкұ°лӮҳ лЁёлҰ¬ мһҘмӢқмқ„ н•ҳкі кҪғлі‘м—җ кҪӮлҠ” мқјмқҙ л§Һм•ҳлӢӨ. мқҙлҘјн…Ңл©ҙ лҸ…мқҙ м—ҶлӢӨлҠ” мқҳлҜёкі л”°лқјм„ң мҡ°лҰ¬лӮҳлқј м—¬мһҗл“Өмқҙ мўӢм•„н•ң кұҙ 진лӢ¬лһҳмҳҖкё°м—җ мҲҳлЎңл¶Җмқё м—ӯмӢң мІ мӯүмқҙ м•„лӢҢ 진лӢ¬лһҳлҘј мӣҗн–ҲлӢӨлҠ” кІҢ мқјл°ҳм Ғ кІ¬н•ҙлӢӨ. лҳҗ н•ҳлӮҳ 진лӢ¬лһҳлҠ” л‘җкІ¬мғҲк°Җ лӮ м•„л“ңлҠ”лҚ° мІ мӯүм—җлҠ” к·ёлҹ° м–ҳкё°к°Җ м—ҶлӢӨ. мғҲлқјл©ҙ нӮӨ нҒ° лӮҳл¬ҙм—җ л‘Ҙм§ҖлҘј нӢҖкІҢ л§Ҳл Ёмқҙлҗҳ лӢЁм§Җ 진лӢ¬лһҳк°Җ л‘җкІ¬нҷ”мҳҖкё° л•Ңл¬ём—җ лӮ м•„л“ңлҠ” мғҲ м—ӯмӢң л‘җкІ¬мғҲмҳҖлӢӨлҠ” кұ°лӢӨ. л‘җкІ¬мғҲк°Җ мҡё мҰҲмқҢ н”јм–ҙм„ң л¶ҷмқҖ мқҙлҰ„мқҙм§Җл§Ң 비мҠ·н•ң кҪғмқ„ кө¬лі„н•ҳлҠ” лҳҗ лӢӨлҘё л°©лІ•мқҙлӢӨ.
진лӢ¬лһҳмҷҖ мІ мӯүк°ҷмқҙ 비мҠ·н•ң кұ°лқјл©ҙ лӘЁлһҖкіј мһ‘м•ҪмқҙлӢӨ. лӘЁлһҖмқҖ мқҙлҜё м ё лІ„л ёкі мһ‘м•ҪлҸ„ лҒқл¬јмқҙм§Җл§Ң, лҸ„лһҖлҸ„лһҖ 비мҠӨл¬ҙлҰ¬н•ҳкІҢ н”јлҠ” мқҙл“ӨмқҖ лҳ‘к°ҷмқҙ м•Ҫмһ¬лЎң м“°мқҙлҠ” кұҙ л¬јлЎ мһҗлқјлҠ” лӘЁм–‘лҸ„ нқЎмӮ¬н•ҙм„ң н—·к°ҲлҰ¬кё° мү¬мҡҙ кҪғл“ӨмқҙлӢӨ. мһ‘м•ҪмқҖ лӢЁм§Җ н’Җмқҙлқјм„ң н•ҙл§ҲлӢӨ мғҲмҲңмқҙ мҳ¬лқјмҳӨлҠ” лҢҖмӢ лӘЁлһҖмқҖ мӨ„кё°м—җм„ң мӢ№мқҙ нҠёлҠ” м—„м—°н•ң лӮҳл¬ҙлӢӨ. лӘЁлһҖмқҖ лҳҗ мІӯмҙҲн•ң кІҢ 진лӢ¬лһҳмҷҖ 비мҠ·н•ҳкі н•Ёл°•кҪғмқё мһ‘м•ҪмқҖ н‘ём§җн•ҳкІҢ н”јм–ҙм„ңмқём§Җ мңЎк°җм Ғмқё мІ мӯүкіј м–ҙм§Җк°„н•ҳлӢӨ. н”јлҠ” мӢңкё°лҸ„ лӘЁлһҖмқҙ лЁјм Җкі мһ‘м•Ҫмқҙ лӮҳмӨ‘мқё кІҢ м•һм„ңкұ°лӢҲ л’Өм„ңкұ°лӢҲ н”јлҠ” 진лӢ¬лһҳмҷҖ мІ мӯү к·ёлҢҖлЎңлӢӨ. к°ҖлҒ” лӘЁлһҖмқҙ н•„ л•Ң м•Ҫк°„ мҢҖмҢҖн•ҳкі мһ‘м•Ҫмқҙ н•„ л•Ң л”°мҠӨн•ҙм§Җл©ҙ мӢңкё°к№Ңм§Җ л§һл¬јл Ө лҚ”лҚ”мҡұ нҳјлһҖмҠӨлҹҪлӢӨ.
к°ҖмһҘ нҷ•мӢӨн•ң л°©лІ•мқҖ лҸ…м„ұмқҳ мң л¬ҙлқјм§Җл§Ң к·ё лҳҗн•ң мқҙм„Өмқҙм—ҲлӢӨлҠ” кІҢ л°қнҳҖмЎҢлӢӨ. м„ лҚ•м—¬мҷ• мҰү лҚ•л§ҢкіөмЈјк°Җ лӘЁлһҖкҪғ лі‘н’Қмқ„ ліҙкі лӮҳ비мҷҖ н–Ҙкё° мҡҙмҡҙн•ҳлҠ” л°”лһҢм—җ н–Ҙкё°к°Җ м—ҶлӢӨкі н•ҙ мҷ”мңјлӮҳ лӘЁлһҖмқҳ кҪғл§җмқҖ л¶Җк·ҖмҳҒнҷ”кі лӮҳ비лҠ” 80мқ„ мғҒ징н–Ҳкё°м—җ 80к№Ңм§Җ лҲ„лҰ¬лқјлҠ” кІҢ м–өм§ҖмҠӨлҹҪкі л”°лқјм„ң мҳӣлӮ мӨ‘көӯмқҳ лӘЁлһҖ к·ёлҰјм—җлҠ” лӮҳ비к°Җ л“Өм–ҙк°Ҳ мҲҳ м—Ҷм—ҲлӢӨ. кіөкөҗлЎӯкІҢлҸ„ мӢ лқј л•Ң л“Өм–ҙ мҳЁ лі‘н’Қмқҙ к·ёлҹ° к·ёлҰјмқҙм—ҲлҠ”лҚ° мҷң мӢ¬м–ҙліёмҰү лӮҳ비к°Җ 진м§ң мҳӨм§Җ м•Ҡм•ҳмқ„к№Ң. лӢ№мӢң мӨ‘көӯм—җм„ңлҠ” кҪғ мӨ‘мқҳ мҷ•мқё лӘЁлһҖмқҳ н’Ҳмў…к°ңлҹүмқҙ н•ңм°Ҫмқҙм—ҲлҠ”лҚ° л№ӣк№”мқҙ нҷ”л Өн•ң кІғл§Ң көҗл°°н•ҳлӢӨ ліҙлӢҲ н–Ҙкё° м—ҶлҠ” кҪғмқҙ лӢӨлҹүмңјлЎң нҚјмЎҢкі м–ҙм©ҢлӢӨ к·ёлҹ° м”Ём•—мқҙ м „н•ҙмЎҢлӢӨкі н•ңлӢӨ.
л°°кІҪмқ„ м•Ңкі ліёмҰү лӮ©л“қмқҙ к°Җкё°лҠ” н–ҲмңјлӮҳ к·ём•јл§җлЎң нҳјлһҖмқҳ м—°мҶҚмқҙлӢӨ. м•ҪмҙҲлқјм„ң мҶҢлҹүмқҳ лҸ…м„ұмқҖ н•Ёмң лҗҳм—Ҳмқ„м§Җм–ём • н–Ҙкё°лҠ” мһҲкё°м—җ лӮҳ비к°Җ лӮ м•„л“ лӢӨ. к·ёлҹ°лҚ°лҸ„ лӘЁлһҖ н•ҳл©ҙ л¶Ҳм‘Ҙ н–Ҙкё° м—ҶлҠ” кҪғмқҙ л– мҳӨлҘҙлҠ” кҙҙлҰ¬к°Җ м°ё лӢ№нҳ№мҠӨлҹҪм§Җл§Ң мһЎмҙҲ мҶҚмқҳ кҪғмқҙ л•ҢлЎң кі мҡҙ кІғмІҳлҹј нҳјлһҖ мҶҚм—җм„ң нҢҢмғқлҗң к°җлҸҷ лҳҗн•ң мқёмғҒм Ғмқј мҲҳ мһҲлӢӨ. м •м„қмқё мӨ„ лҜҝм–ҙ мҳЁ кІғ мӨ‘м—җ мҳӨлҘҳк°Җ л§ҺмқҖ кұҙ нқ”н•ң мқјмқҙлҗҳ м„ёмғҒ л¶ҲліҖмқҳ лІ•м№ҷмқҙ кі§ лӘЁл“ кІғмқҖ л°”лҖҗлӢӨлҠ” к·ё лІ•м№ҷмқҙлқјл©ҙ мғҲмӮјмҠӨлҹ¬мҡё кІҢ м—ҶлӢӨ. мІ м Җн•ҳкІҢ лҜҝм—ҲлҚҳ мқҙл…җкіј к°Җм№ҳкҙҖмқҙ нҳјлһҖмҠӨлҹ¬мҡё л•Ңк°Җ л§ҺмңјлӮҳ к·ёлҹ° мҶҚм—җм„ң л°ңкІ¬лҗҳлҠ” мқҙл…җлҸ„ мҶҢмӨ‘н•ҳлӢӨ. мӢӨл§қн•ҳкё°ліҙлӢӨлҠ” л°”лҖҢлҠ” м„ёмғҒмқҳ лӢЁл©ҙмқ„ мҡ©лӮ©н• лҸҷм•Ҳ к№ЁлӢ«лҠ” м„ӯлҰ¬к°Җ мқҳмҷёлЎң л§ҺлӢӨл©ҙ кІ¬л”ңл§Ңн–ҲлӢӨ.
비мҠ·н•ҳкІҢ н”јлҠ” кҪғмқҙ мІ мІ мқҙ л§ҺмқҖ кІғлҸ„ к·ёлҹ° мқҙм№ҳлҘј мҲҳл°ҳн•ңлӢӨ. 진лӢ¬лһҳмҷҖ мІ мӯүмқҙ н”јлҠ” мӢңкё°к°Җ л¶ҲмІӯк°қ кҪғмғҳ л•Ңл¬ём—җ лҙ„мқём§Җ кІЁмҡёмқём§Җ лӘЁлҘј нҳјлһҖмқҳ м—°мҶҚмқҙм—Ҳм§Җл§Ң лӘЁлһҖкіј мһ‘м•Ҫмқҙ н•„ л•ҢлҠ” лҳҗ лҙ„мқём§Җ м—¬лҰ„мқём§Җ м• л§Өн•ң кұё ліҙл©ҙ лҠҗлӮҢмқҙ л¬ҳн•ҳлӢӨ. кҪғмғҳ л¬ҙл өм—җлҠ” лӮ м”Ё л•Ңл¬ём—җ к·ёлӮҳл§ҲлҸ„ лӘ…нҷ•нһҲ кө¬л¶„лҗҳм—Ҳм§Җл§Ң лӘЁлһҖкіј мһ‘м•ҪмІҳлҹј н—·к°ҲлҰҙ л§Ңм№ҳ 진н–үлҗҳлҠ” нҳјлһҖлҸ„ л§ҺлӢӨ. к·ёлҹ¬лӮҳ н•ӯн•ҙн•ҳлҠ” л°°к°Җ н‘ңлҘҳн•ҳл©ҙм„ң м •нҷ•н•ң н•ӯлЎңлҘј м°ҫлҠ” кІғмІҳлҹј к·ёлҹ° нҳјлһҖ л•Ңл¬ём—җ мһ‘м•Ҫмқҙ м§Җкі л№„лЎңмҶҢ м—¬лҰ„мқҙ лҗңлӢӨлҠ” мӮ¬мӢӨмқҙ лҚ” к·№лӘ…н•ҙм§Җм§Җ м•Ҡмқ„к№Ң. 진лӢ¬лһҳк°Җ н•„ мҰҲмқҢмқҖ мң лҸ… мҢҖмҢҖн•ҙм„ң кІЁмҡёмқ„ лҢҖл№„н• л•ҢмІҳлҹј кёҙмһҘн•ҙм•ј лҗңлӢӨлҠ” мӮ¬мӢӨлҸ„ мҲҳмӢӯ л…„мқҳ лҙ„мқҙ м§ҖлӮң лҒқм—җ м•Ңм•ҳмңјлӢҲк№Ң.
м•һм„ң 진лӢ¬лһҳлҸ„ лӮңмҙҲк°ҷмқҙ м§„н• л•ҢлҠ” лӮңлӢ¬лһҳлқјкі н•ң кІғмІҳлҹј 진лӢ¬лһҳлҸ„ мІ мӯү к°ҷмқҖ кё°м§Ҳмқҙ лӢӨ분н•ҳкі м§„лӢ¬лһҳк°ҷмқҙ м—°н•ң мІ мӯүлҸ„ мһҲлӢӨ. л№ӣк№”мқҙ м§ҷмқҖ лӘЁлһҖмқҖ мһ‘м•Ҫкіј 비мҠ·н•ҳкі мһ‘м•ҪлҸ„ нқҗлҰ° кІғмқҖ лӘЁлһҖкіј м–ҙм§Җк°„н•ҳлӢӨ. мІңм„ұм ҒмңјлЎң 비мҠ·н•ң мқҙл“Өмқҳ 3мӣ” л§җл¶Җн„° 6мӣ”к№Ңм§Җ мқҙм–ҙм§ҖлҠ” кҪғ к·ёлһҳн”„лҠ” лҸ…м„ұмқҳ мң л¬ҙлҝҗмқҙ м•„лӢҢ л№ӣк№”мқҳ лҶҚлӢҙк№Ңм§Җ м •нҷ•н•ҳкІҢ кё°мһ…н•ҳм§Җ м•Ҡмңјл©ҙ нҢҢм•…н•ҳкё°к°Җ мүҪм§Җ м•ҠлӢӨ. м„ёмғҒм—җ OX л¬ём ңл§Ң мһҲлҠ” кІҢ м•„лӢҲлқјлҠ” кұҙ мқҙнҺёлҸ„ м Җ нҺёлҸ„ м•„лӢҢ м• л§Өн•ң мҶҚм—җм„ң л“ңлҹ¬лӮҳлҠ” м„ӯлҰ¬мҷҖ кІҪмқҙлЎңмӣҖлҸ„ л¬ҙмӢңн• мҲҳ м—ҶлӢӨлҠ” кұёк№Ң. кІ°көӯ лҒқк№Ңм§Җ мқҳнҳ№мқҳ лҢҖмғҒмқј мҲҳл°–м—җ м—Ҷм§Җл§Ң нҳјлһҖмқҙ мҳӨлһҳмқјмҲҳлЎқ нҷ•мӢӨнһҲ к№Ёмҡ°м№ҳл©ҙм„ң лҚ” мқҙмғҒмқҳ нҳјлһҖмқҖ м—ҶкІҢ лҗҳлҠ” м„ӯлҰ¬лҘј л°°мӣ 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