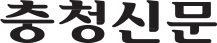ліём§Җк°Җ к·ё мқҳлҜёмҷҖ кіјм ңлҘј мһ¬мЎ°лӘ…н•ҳкі н–Ҙнӣ„ лӮҳм•„к°Җм•ј н• л°©н–Ҙмқ„ м ңмӢңн•ң кІғмқҖ мӢңмӮ¬н•ҳлҠ” л°”к°Җ нҒ¬лӢӨ.
м§ҖлӮң 1995л…„ лҢҖн•ңлҜјкөӯм—җм„ң лҜјм„ м§Җл°©мһҗм№ҳк°Җ л¶Җнҷңн•ң м§Җ 30л…„мқҙ нқҳл ҖлӢӨ.
мқҙ кё°к°„мқҖ мҡ°лҰ¬ мӮ¬нҡҢм—җ вҖҳн’ҖлҝҢлҰ¬ лҜјмЈјмЈјмқҳвҖҷлқјлҠ” мғҲлЎңмҡҙ к°Җм№ҳмҷҖ мӢӨмІңмқ„ м•Ҳм°©мӢңнӮЁ м—ӯмӮ¬м Ғ м „нҷҳм җмқҙлӢӨ.
лҢҖм „ 충мІӯк¶Ңмқҙ м§ҖлӮң 30л…„к°„ лҜјм„ мһҗм№ҳк°Җ к°Җм ёмҳЁ мЈјмҡ” м„ұкіјмҷҖ к·ё мқҳлҜёлҘј лӢӨм§ҖлҠ” кІғлҸ„ л°”лЎң мқҙ л•Ңл¬ёмқҙлӢӨ.
1995л…„ 6мӣ” 27мқј, м ң1нҡҢ м „көӯлҸҷмӢңм§Җл°©м„ кұ°к°Җ мӢӨмӢңлҗҳл©ҙм„ң мЈјлҜјл“ӨмқҖ мІҳмқҢмңјлЎң м§Җл°©мһҗм№ҳлӢЁмІҙмһҘкіј м§Җл°©мқҳнҡҢ мқҳмӣҗмқ„ м§Ғм ‘ м„ м¶ңн•ҳкІҢ лҗҳм—ҲлӢӨ.
мқҙлҠ” 1961л…„ 5В·16 кө°мӮ¬м •ліҖ мқҙнӣ„ 30м—¬ л…„к°„ мӨ‘лӢЁлҗҗлҚҳ м§Җл°©мһҗм№ҳмқҳ мҷ„м „н•ң л¶Җнҷңмқ„ мқҳлҜён•ңлӢӨ.
м§Җл°©мһҗм№ҳлҠ” 1948л…„ н—ҢлІ•м—җ лӘ…мӢңлҗҳм–ҙ 1949л…„ м§Җл°©мһҗм№ҳлІ•мқҙ м ңм •лҗҳл©° мӢңмһ‘лҗҗмңјлӮҳ, мҳӨлһң кё°к°„ м •м№ҳм Ғ кІ©ліҖкіј мӨ‘м•ҷ집к¶Ңм Ғ нҶөм№ҳлЎң мқён•ҙ мӢӨм§Ҳм ҒмңјлЎң мһ‘лҸҷн•ҳм§Җ лӘ»н–ҲлӢӨ.
лҜјм„ мһҗм№ҳ 30л…„мқҳ к°ҖмһҘ нҒ° м„ұкіјлҠ” мЈјлҜј лӘЁл‘җк°Җ м§Җм—ӯмқҳ мӢӨм§Ҳм Ғ мЈјмқёмқҙ лҗҳлҠ” вҖҳн’ҖлҝҢлҰ¬ лҜјмЈјмЈјмқҳвҖҷмқҳ мӢӨнҳ„мқҙлӢӨ.
мЈјлҜјл“ӨмқҖ м„ кұ°лҘј нҶөн•ҙ м§Ғм ‘ мһҗм№ҳлӢЁмІҙмһҘкіј м§Җл°©мқҳмӣҗмқ„ лҪ‘кі , мЈјмҡ” м •мұ… кІ°м •м—җ м°ём—¬н•ҳлҠ” к¶ҢлҰ¬лҘј к°–кІҢ лҗҳм—ҲлӢӨ.
мЈјлҜјнҲ¬н‘ң, мЈјлҜјмҶҢнҷҳ, мЈјлҜј к°җмӮ¬мІӯкө¬ л“ұ лӢӨм–‘н•ң м°ём—¬м ңлҸ„к°Җ лҸ„мһ…лҗҳм–ҙ м§Җл°©н–үм •м—җ лҢҖн•ң мЈјлҜјмқҳ нҶөм ңмҷҖ м°ём—¬к°Җ нҷ•лҢҖлҗҗлӢӨ.
мқҙлҘёл°” кҙҖм№ҳ мӨ‘мӢ¬мқҳ н–үм •мқҖ мЈјлҜј м№ңнҷ”м Ғ н–үм •мңјлЎң ліҖлӘЁн–Ҳкі , н–үм •м„ң비мҠӨмқҳ м§ҲлҸ„ нҒ¬кІҢ н–ҘмғҒлҗң м…ҲмқҙлӢӨ.
мӨ‘м•ҷм •л¶Җм—җ 집мӨ‘лҗҗлҚҳ к¶Ңн•ңкіј мһ¬м •мқҙ м җ진м ҒмңјлЎң м§Җл°©мңјлЎң мқҙм–‘лҗҳл©ҙм„ң, к°Ғ м§Җм—ӯмқҖ нҠ№мғүмһҲлҠ” л°ңм „мқ„ лӘЁмғүн• мҲҳ мһҲмқҢмқҖ мЈјм§Җмқҳ мӮ¬мӢӨмқҙлӢӨ.
1995л…„ 42мЎ° 6мІңм–ө мӣҗмқҙм—ҲлҚҳ м§ҖмһҗмІҙ мҳҲмӮ°мқҖ 2024л…„ 310мЎ°1000м–өмӣҗмңјлЎң 8л°° к°Җк№Ңмқҙ мҰқк°Җн–Ҳкі м§Җл°©м„ё 비мңЁлҸ„ нҒ¬кІҢ лҠҳм—ҲлӢӨ.
мһҗм№ҳмһ…лІ•к¶Ң к°•нҷ”лЎң мһҗм№ҳлІ•к·ң мҲҳк°Җ 3л°° мқҙмғҒ мҰқк°Җн•ҙ м§Җм—ӯ мӢӨм •м—җ л§һлҠ” м •мұ…лҸ„ нҺј мҲҳ мһҲлӢӨ.
м„ңмҡёмқҳ лҸ„мӢңмһ¬мғқ, л¶ҖмӮ°мқҳ кёҖлЎңлІҢн—ҲлёҢ лҸ„мӢң, лҢҖм „мқҳ кіјн•ҷмҲҳлҸ„, м ңмЈј көӯм ңмһҗмң лҸ„мӢң л“ұ м§Җм—ӯ нҠ№нҷ” л°ңм „мқ„ кІЁлғҘн•ң к°Ғмў… мҠ¬лЎңкұҙмқҙ л°”лЎң к·ёкІғмқҙлӢӨ.
мқҙ к°ҷмқҖ м§Җл°©мһҗм№ҳмқҳ л°ңм „ кіјм •м—җм„ң к°Ғ м •л¶ҖлҠ” м§Җ방분к¶Ңмқ„ мң„н•ң лӢӨм–‘н•ң м •мұ…кіј м ңлҸ„лҘј лҸ„мһ…н•ң м§Җ мҳӨлһҳлӢӨ.
к·ёлҹ¬лӮҳ 30л…„мқҳ м„ұкіјм—җлҸ„ м—¬м „нһҲ к·ё н•ңкі„лҘј лІ—м–ҙлӮҳм§Җ лӘ»н•ҳкі мһҲлӢӨ.
мӨ‘м•ҷм •л¶Җ к¶Ңн•ңкіј мһ¬м •мқҳ м§Җл°© 분мӮ°мқҙ м•„м§Ғ 충분н•ҳм§Җ м•Ҡм•„, м§Җл°©м •л¶Җмқҳ мһҗмңЁм„ұкіј мһҗлҰҪм„ұмқҙ лҜёнқЎн•ҳлӢӨлҠ” м§Җм Ғмқҙ лӮҳмҳЁлӢӨ.
м§Җл°©м •м№ҳк°Җ мӨ‘м•ҷм •м№ҳм—җ мў…мҶҚлҗң кө¬мЎ°, м§Җм—ӯ к°„ мһ¬м • л¶Ҳк· нҳ•, мӢӨм§Ҳм Ғ мЈјлҜј м°ём—¬мқҳ н•ңкі„ л“ұмқҖ м—¬м „нһҲ н’Җм–ҙм•ј н• н•өмӢ¬кіјм ңлӢӨ.
мһҗм№ҳВ·мһ¬м • 분к¶Ңмқҙ м§Җм—ӯ мһҗмңЁм„ұкіј мһҗлҰҪмқ„ лӢҙліҙн• л§ҢнҒј мқҙлӨ„м§Җм§Җ м•Ҡм•ҳлӢӨлҠ” м§Җм Ғмқ„ к°„кіјн•ҙм„ңлҠ” м•Ҳ лҗңлӢӨ.
лҜјм„ мһҗм№ҳ 30л…„мқҳ кІҪн—ҳмқҖ м§Җл°©мһҗм№ҳк°Җ лӢЁмҲңн•ң м ңлҸ„м Ғ ліҖнҷ”м—җ к·ём№ҳм§Җ м•Ҡкі , мӢӨм§Ҳм Ғ 분к¶Ңкіј мЈјлҜј м°ём—¬мқҳ нҷ•лҢҖ, м§Җм—ӯмқҳ мһҗмңЁм Ғ л°ңм „мңјлЎң лӮҳм•„к°Җм•ј н• л°©н–Ҙмқ„ мӢңмӮ¬н•ңлӢӨ.
мӨ‘м•ҷм •л¶ҖлҠ” к¶Ңн•ңкіј мһ¬мӣҗмқҳ кіјк°җн•ң мқҙм–‘мқ„ нҶөн•ҙ м§Җл°©мқҳ мһҗлҰҪ кё°л°ҳмқ„ к°•нҷ”н•ҳкі , м§Җм—ӯмӮ¬нҡҢлҠ” мЈјлҜј м°ём—¬мқҳ нҸӯмқ„ л„“нҳҖ мӢӨм§Ҳм Ғ лҜјмЈјмЈјмқҳлҘј мӢӨнҳ„н•ҙм•ј н•ңлӢӨ.
м§Җ방분к¶Ң к°ңн—Ң л“ұ м ңлҸ„м Ғ ліҙмҷ„кіј н•Ёк»ҳ, м§Җм—ӯ к°„ к· нҳ•л°ңм „кіј мӢңлҜјмӮ¬нҡҢмқҳ м—ӯлҹү к°•нҷ”к°Җ лҸҷл°ҳлҗҳм–ҙм•ј н• кІғмқҙлӢӨ.
1995л…„ лҜјм„ мһҗм№ҳмқҳ л¶ҖнҷңмқҖ лҢҖн•ңлҜјкөӯ лҜјмЈјмЈјмқҳмқҳ м§ҖнҸүмқ„ л„“нһҢ м—ӯмӮ¬м Ғ мӮ¬кұҙмқҙлӢӨ.
к·ёлҹ¬лӮҳ м•һм„ң м–ёкёүн–Ҳл“Ҝ м•„м§ҒлҸ„ лӮЁмқҖ кіјм ңлҠ” м Ғм§Җ м•ҠлӢӨ.
м•һмңјлЎңмқҳ 30л…„мқҖ ліҙлӢӨ мҳЁм „н•ң м§Җ방분к¶Ңкіј мӢӨм§Ҳм Ғ мЈјлҜјмһҗм№ҳ мӢӨнҳ„мқ„ мң„н•ҙ, мҡ°лҰ¬к°Җ лӘЁл‘җ н•Ёк»ҳ кі лҜјн•ҳкі мӢӨмІңн•ҙм•ј н• мӢңкё°лӢӨ.